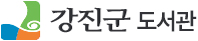다른 세상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서사
- S. I -
거리의 백발 투사, 백기완 선생. 『버선발 이야기』는 영어와 한자어를 섞지 않은 낯선 우리말로 싱싱하고 구수하며 감칠맛이 돌았다. 활자에 갇힌 글이지만 귀로 듣는 살아 있는 말 같았다. 그 말 속에 머슴으로 살아온 정서와 그 앞에 오롯이 선 정신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버선발이 겪는 사건의 연속은 매 순간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숨 가쁘게 다가왔다. 민중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서사시이자 민중 정서를 담은 서정시였다.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한판의 마당극이기도 했다. 수백 년 동안 머슴들이 흘린 눈물은 타령조였다.
어린 버선발은 집에 혼자 남아 새끼줄에 매단 밥보자기를 떼려고 콩다콩 콩다콩 뛰었다. 남의 집 머슴을 사는 엄마가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시게 되면 집구석이라는 게 버선발의 그 알량한 밥이나마 차려놓을 만한 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밥 냄새를 맡은 집쥐들만 아글아글 덤벼드는 것이 아니다. 들쥐 새끼들까지 다투어 쑤셔 먹으려 드니 어쩔 수가 있는가. 밥보자기를 아예 새끼줄에 매달아놓아 버선발은 그것을 떼느라 콩다콩 콩다콩 한참만에야 밥보자기를 낚아채 펼쳐보았자 기름기가 찰찰 밴 쌀밥이기는커녕 까실하게 말라 배틀어진 깡조밥 한 덩어리.(P14)
“남의 목숨인 박땀, 안간 땀, 피땀만 뺏어먹으려 들지 말고 너도 사람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다 함께 박땀, 안간 땀, 피땀을 흘리자. 그리하여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벗나래(세상)를 만들자. 너만 목숨이 있다더냐. 이 땅별(지구), 이 온이(인류)가 다 제 목숨이 있고 이누룸(자연)도 제 목숨이 있으니 다 같이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거, 그게 바로 노나메기라네.”
“얼핏 눈에 어리는 그림자를 보아하니 버선발이 서 있는 발밑이 바로 옛날 옛집 바윗돌로 된 부엌 바닥이었다. 이에 버선발은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하던 버릇대로 그대로 발뒤꿈치를 슬쩍 들었다가 한 술쯤 콩다콩 하고 짓찧었을 뿐이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커다란 바위텀(바위산)이 통째로 쩡, 쩍, 쩌정쩡 갈라지더니만 마침내 팍삭 주저앉고 말았다.”
“그 많은 칼잡이와 활잡이들이 더러는 팽 하고 나가동그라지고, 더러는 겨울 칼바람에 깡마른 수수깡 아사지듯 아그그 자빠지고, 또 더러는 비칠대다가 마치 우박 맞은 날짐승처럼, 한여름 서리 맞은 쭉정이 무 잎처럼 까마득한 벼랑으로 나풀나풀 떨어지니 버선발인들 어찌 어찌 손을 써 살릴 길이 없었다.”(P217)
버선발 이야기에는 민중의 문화가 스며있다. 너도나도 일하고, 너도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노나메기 세상.
‘내 것은 거짓말’이라는 민중사상의 핵심이다. 땅에 떨어진 땀은 한 줌 거름일 뿐이라는 가르침.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자연의 재생산 구조에 속한 것일 뿐이라는 깨달음이다.
백기완 선생은 이 책의 마지막에 버선발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다.
“그 맨 뒤에서 온몸이 핏덩어리라 쌍이로구 누구인지를 도통 알아볼 수가 없게끔 눈만 반짝반짝하는 한 아저씨가 다리 부러진 지게를 한쪽 어깨에다 비스듬히 걸친 채 소리 없는 울음을 펑펑 울면서 따라가더라는 이야기이다.”
버선발은 영웅이 아니다. 버선발은 오랜 길거리 싸움의 상처인 지팡이를 짚으며 지금도 힘겹게 한 시대의 고개를 넘고 있는 백기완이고 우리 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