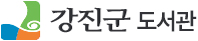강진군도서관 우리들 서평단 김미진
언제인가부터 광화문 광장의 시위대는 규모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익명성에 기대 개인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한 시민의식의 등장이라고 할 것이다.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상업적 노출 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1인 TV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노출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와 무관하게 거대한 감시체계 속으로 들어가 있음이다. 현관을 나서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안카메라에 찍힌 우리는 곧 주차장에 나타나고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신호대기 카메라에 출현하면서 은행과 편의점, 골목과 공용화장실, 식당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휘트니스 클럽과 산책로, 직장 곳곳에 보관되는 장면까지 채집하면 우리 일상은 그대로 다큐멘터리가 되는 셈이다. 구글에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마저 제공한다면 지구에서 숨을 곳은 없다. 드러냄을 부추기며 스펙타클에 열광하는 사회, 누구에게나 '15분간의 명성'이 약속된 현대 사회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그늘도 숨을 데도 없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앙에 위치한 간수에게 잘 노출되게끔 고안되었던 벤담의 감옥과 다를 바 없다.
감시가 일상화되고 자기 이미지에 일말의 여지도 없이 복속된 사회,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 전체주의인 현대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고 소란한 삶으로의 진화에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제목부터 시작해 잠시 사색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일독을 권해 보는 이유이다. 저자는 일반화된 감시, 노출증에 대한 열광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내지 않기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드러내지 않기> 라는 감성적 제목과는 다르게 이 글은 철학서이다. 저자 피에르 자위는 프랑스 철학자이다. 그리스철학에서 유신론, 무신론을 거쳐 벤야민, 한나 아렌트까지 서양 사상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짚어가며 <드러내지 않기> 경험의 고유함과 독창성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드러내지 않기'는 우리가 아는 그 내숭(수치심)도 겸손(조심성)도 '알맞은 중간'을 규정하는 자질도 아니다.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형태로서 정원에 틀어박히는 은둔과 자기 자신에 틀어박히는 은둔도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통찰력 있는 자기 자신, 각별히 세련된 형태의 나르시시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대체 그 경험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는가? 하루쯤 철학자가 되어 인생의 일요일 사유의 초원에 누워 즐거움을 누려 보시라!
"드러내지 않기는 그 적용 대상, 장소, 시간이 뭐든 간에 애초부터 타자, 혹은 세계에 어떤 여지를 내주기 위해서 자신의 드러남을 제한하는 것···자기가 과하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에 들어간다. -p. 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