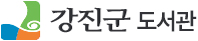자유게시판
길 위에 인문학
길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은 길 위에 이야기를 남긴다.
겱국 길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두번째 탐방, 동영 가는 길
길 위에 이야기가 산다.
실 위에 이야기처럼 사람이 산다.
길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오늘은 낯선 이들과 함깨 걷는다.
낯섬. 은 설렘으로 이어어진다.
비도 살짝 내리는 날에 낯선 사람과의 동행
기분좋은 두근거림에 자연스레 마도 많아지고,
주변 사람에게 말도 쉽게 걸만큼 마음마저 가볍다.
통제영이 있었던 곳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
조선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던 그는,
저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을까? 무거웠을까?
그에게 바다는 죽음과 삶 어디에 가까울까?
큰 칼 옆에 차고 홀로 맞이한 바다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바다는 그에게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 혼자 견딜 수 있었을까? 그리하여 바다는 외롭다.
서벼랑과 동벼랑에서 내려다 본 통영.
저 바다를 나와 더불어
박경리도, 유치환도, 윤이상도, 김춘수도, 봤을 것이다.
그리하여, 바다는
소설이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또한 한 여자를 사랑해 이곳까지 내려온 백석이라는 남자도,
저 바다를 보면서 님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길은 이처럼 많은 사연들을 품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길에서 삶은 시작되고, 익어가고, 다시 흩어져 사람에게 닿는다.
그리하여 이야기가 되었다.
| 다음글 | 2018 강진 뿜뿜 막걸리 나눔 축제. 김장 체험 및 나눔 행사 참가자 모집 공고 | 2018-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