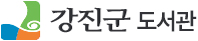[책 한권이 강진을 바꾼다] 강진군도서관 우리들 서평단 김미진
노동[labor(영), travail(프)]의 어원은 고통이다. 특히 노동(labor)의 어원은 속박이다. 그런 이유로 과거에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뜻했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 지도 모른다.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았던 산업화 이전의 일터에서 사람들은 지치면 자기도 하고, 무료하면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셨다.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와 결합해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노동은 오랫동안 규범이자 의무로 여겨졌다. <<당분간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의 '삽질'에 관한 8편의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다.
순전히 제목이 주는 상상에 이끌린 선택이다. 딱딱해서 부서지거나, 물렁물렁 녹아서 사라지기까지 <당분간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익명의 주인공들을 따라 가다 보면 출구 없는 <검은 문>에 봉착하게 된다.
트윈 싸이보그로 버티다 <저것은 사람도 아니다> 소리를 듣든지, 감시하던 <타인의 삶>에 투영되든지, <그곳의 단잠>으로 서로의 결핍을 교환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이름은 없고 직급과 성(姓), 이니셜만 갖고 있다. 이른 바 인격은 없고 노동력으로만 존재하는 우리사회 을의 노동 현장을 변주하고 있음이다.
출근길 폭설을 향한 <스노우맨>의 삽질은 <삽의 이력>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노동인 '삽질'이 된다. 치매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김은 구덩이를 파야하고, 데이트 비용이 필요한 윤은 구덩이를 메워야 한다. 시지프스의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신성한 노동으로서의 '삽질'이 은어(隱語) '삽질하다'로 중첩되면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지쳐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 누구를 위한 노동인가?
인간은 절망적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돌파구를 찾아 씩씩하게 진화해왔다. 슈마허는 몇 가지 좋은 노동의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고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주기도 했다.
"꿀벌의 벌집은 많은 인간 건축가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가장 서투른 건축가라도 가장 훌륭한 꿀벌과 처음부터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집을 짓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짓는다는 사실이다."
노동의 결과가 노동자의 상상력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으로 동물과 다른 인간 고유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일'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좋은 글이란 독자의 독법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작가의 부정적 전망에 동의하지 않으면 희망의 단서를 찾아내고 낙관에 대해 회의적이면 희망의 종아리를 꺾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테니! 요즘 인문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당분간 인간'의 삽질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대는 '당분간 인간'의 정의에서 자유로울까? 일독을 권한다.